바람 타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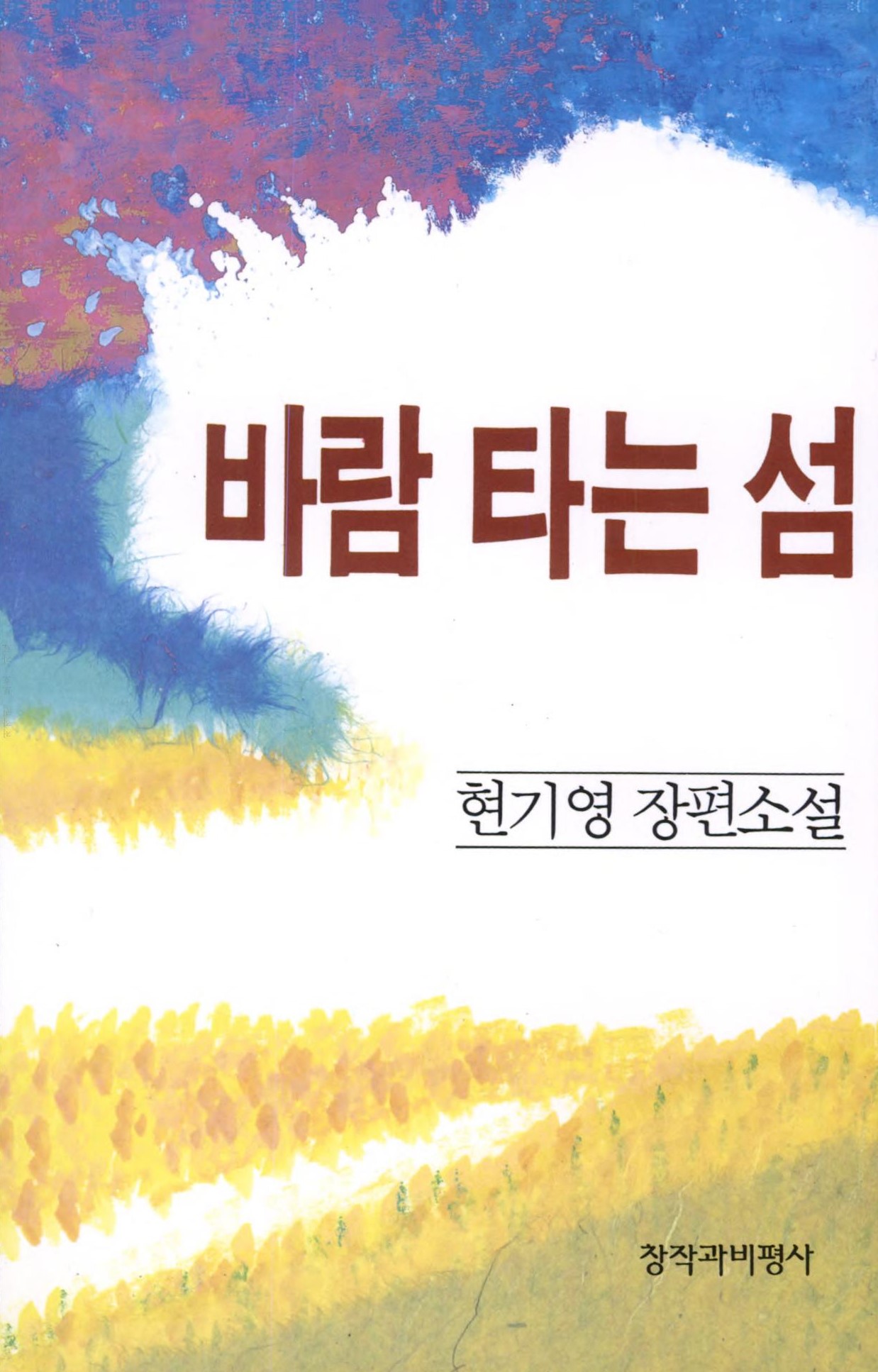
《바람 타는 섬》_1989_현기영
정의
현기영이 1989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한 장편소설.
내용
현기영(1941~ )이 1988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창간과 더불어 연재한 장편소설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 1989년 창작과비평사에서 나온 단행본이다. 신문 연재 때의 삽화는 제주 출신 화가 강요배가 그렸다.
《바람 타는 섬》은 제주해녀들의 삶과 투쟁이 총체적으 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생활인으로서의 해녀, 항쟁 주체로서의 해녀의 모습을 잘 재현해 내고 있다.
바깥물질에 나선 ‘여옥’ 등은 울산 목섬 부근에서 작업을 한다. 섬 주위에 스무 척 가량 떠 있는 배마다 여남은 명의 해녀들이 딸려 물질을 하는데 초여름인데도 수온이 차가운지라 해녀들이 무척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제주바다에서는 1시간씩 하루 4~5차례 물질하던 제주해녀들이 울산바다에서는 30분씩 8차례 작업을 하게 된다. 몸이 언 해녀들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정신없이 화덕불이 있는 곳으로 덤벼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통스런 바깥물질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까지 나선다. ‘덕순이’는 점심때 첫 진통이 왔는데도 물질을 계속 했다고 털어놓는다. 결국 동무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던 덕순이는 길에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기에 이른다. 그렇게 길에서 딸을 낳은 덕순이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물질작업을 재개한다. 그녀가 물질하는 동안에는 남자 사공이 배 위에서 작은 구덕에 놓인 아기를 돌봤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바깥물질을 가는 경우는 더 많았다. 아기업개 소녀 를 고용하여 물질을 갔는데 그렇게 데리고 간 어린아이가 여남은 명이 되었다.
해녀들은 모진 바람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작업을 하다가도 강풍이 몰아칠 기운이 느껴지면 지체없이 철수해야 했다. 해녀들은 서둘러 함께 노를 저어야 살아날 수 있었다. 공포를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물질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만 큼 제주해녀들의 물질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작업이고, 바깥물질을 나갈 경우에는 그 고통이 더욱 극심했음을 《바람 타는 섬》에서는 보여준다.
이 작품은 1930년대에 벌어진 제주해녀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작품에서 보면 해녀 투쟁의 기저에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를 대표하는 세 청년의 진지한 토론과 열정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해녀만이 아니라 지식인들도 함께한 온 도민의 항쟁이었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바깥물질 나간 세화·하도 마을 해녀들은 갖은 수탈을 당한다. 뼈 빠지게 노동을 하면서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전주, 서기, 현지 어업조합 등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해녀들을 기만한다.
고통 속에서 세월을 견딘 후 바깥물질 마치고 귀향한 해녀들은 현실의 모순을 절감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다. “소로 못 나면 여자로 나고 여자 중에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잠녀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개미같이 일하는 우리 잠녀, 아니 개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우리 잠녀들”이라며 자신 들의 처지를 토로한다. 원래 힘든 생활에 더하여 착취까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제주해녀들은 어용 해녀조합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결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착취의 배후에는 일제가 있으니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은 곧 항일투쟁이기도 하다.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은 이처럼 투쟁하는 해녀상, 공동체로서의 해녀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특징과 의의
《바람 타는 섬》은 제주도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지녀온 자치주의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당시로선 모든 모순의 원천이던 일본제국주의에 공동체적으로 대항했던 투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아낸 소설이다. 1932년의 해녀항일투쟁이 중심 사건으로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은 물론이요, 제주해녀들의 생활상이 생생히 재현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 제주 대학교 출판부, 1998.
필자
김동윤(金東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