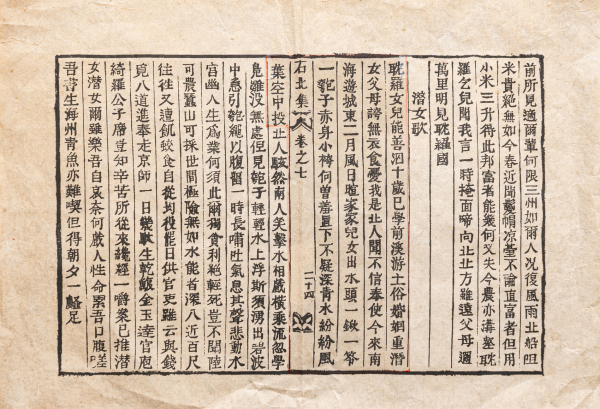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이 사전은 제주해녀 문화의 역사, 명칭, 터전, 채취물, 물옷과 도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아낸 해녀종합보고서다.


-
음식
해녀 음식이란 제주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한 소라, 전복, 우뭇가사리, 톳 등 어패류나 해조류를 재료로 하여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제주 사회는 해 -
예술/학술
-
역사
해녀는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소라·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해녀의 본고장인
-
신앙
16세기 초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 풍속이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곳곳에서 신에게 제사한다고 하였다. 매년 정월에 마을에서 무당이 제사하고, 2월에는 연등이라는 의례를 벌
-
명칭
해녀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달리 ‘잠녀, 잠수’라고도 한다. 1995년
-
문화유산
문화재는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큰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이 보호되어야 할 것을 일컫는다. 문화재가 법적 용어로 공식화된 것은 1962년에
-
구비전승
-
물질
물질은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물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자연적 조건이
-
바다밭
'바당밧(바다밭)'은 만조 시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시에만 드러나는 곳인 ‘조간대’와 그보다 수심이 깊은 ‘조하대’로
-
해녀 단체
해녀항일운동 정신을 계승하거나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며 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다.
먼저 1995년에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다. 19 -
현대
해방 후 관행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해녀들의 조직체인 잠수회 등은 수산정책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변화되었다.
미군정시대(1945~1948년) 해녀들이 사용 -
행위
-
축제
-
갈조류
갈조류는 과거에 갈조식물문(Phaeophyta)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의 분류체계는 진핵생물군(Eu-karyota), 유색조생물계(Chromista), 부등편모조식물
-
드라마
제주해녀가 일부 등장하는 드라마들은 더러 제작되어 왔지만 극 전체를 제주해녀의 이야기로 담았던 드라마는 극히 드물다. 오롯이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처음 제작한 건 K
-
물옷
물옷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이건의 《제주풍토기》(1628)에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
솜국
솜의 알을 넣어서 끓인 국.
-
ᄇᆞ름 쎄젠 허민 구젱기 ᄌᆞ그뭇이 ᄃᆞᆯ라부튼다
풍랑이 일어 물살이 세지면 소라는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긋하게 달라붙는다는 말이다. 소라는 원시복족목 소랏과에 딸린 연체동물로 바위에 닿은 넓은 배가 다리가 되어 이동
-
트다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빗창’이나 ‘ᄀᆞᆯ겡이’ 등을 이용하여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 오분자기, 군부 따위를 채취하다.
-
성게국
성게 알을 넣어 끓인 국.
-
산호해녀
바다거북을 구해준 뒤 바닷속 용궁에서 산호꽃가지를 선물 받고 돌아와 간직했더니 마마를 앓지 않고 지냈다는 해녀 이야기.
-
제주해녀의 바깥물질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출가물질을 나갔던 제주해녀의 생활사를 그린 제주어 다큐드라마.
-
제주해녀문화
제주해녀들의 물질 작업과 일상생활에서 생겨난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
-
할망래퍼: 이어도사나
제주해녀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민요 ‘이어도사나’를 현대의 힙합 버전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다룬 KCTV 제주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
해녀_제주해녀박물관
-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_제주학연구센터
-
해녀와 해녀도구_제주학연구센터
-
문화상징100선 15-1 거센땅, 바람의 여자 해녀_제주문화방송(주)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신청궤)_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구술조사(구좌읍 행원리-해녀노래)_제주학연구센터
-
해녀-성산읍 시흥리_서재철
-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전통 공연ㆍ예술)_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해녀 물질_안장헌
-
2019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4편)-제주해녀항일운동_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의 해신당-서귀포시 보목동 연디기여드렛당_강정식
-
어멍의 바당(1화)_KBS제주방송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