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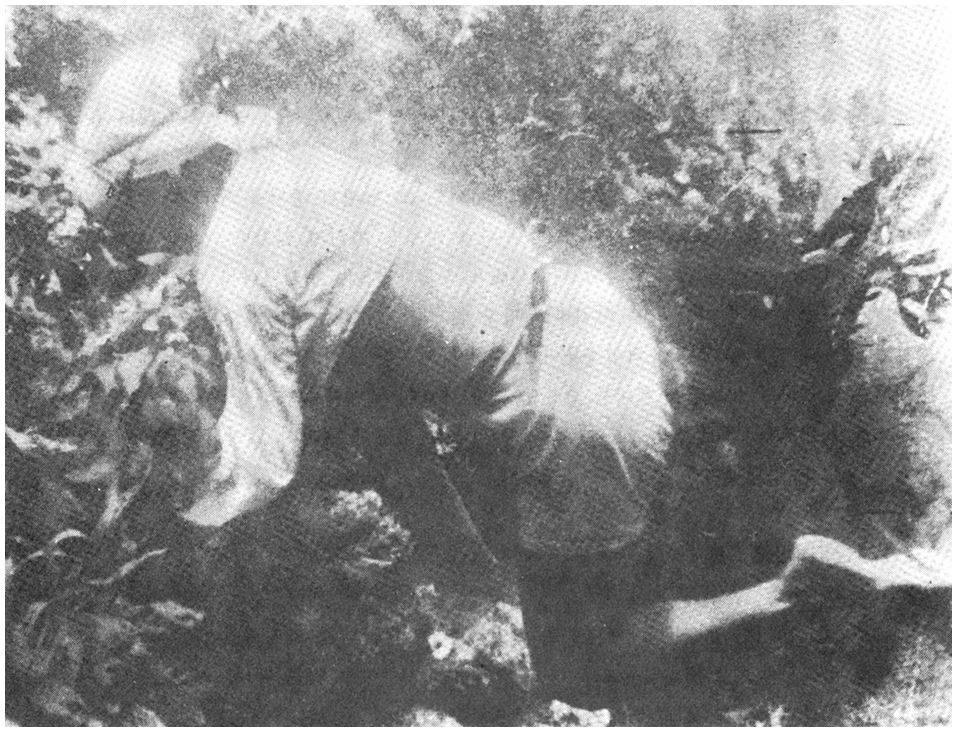
물질_1960년대 이전_《제주시수협 100년사》
개관
물질은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물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자연적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바람, 파도나 물결, 물때 등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불어와 파도나 물결에 영향을 준다. 방향에 따른 바람으로 샛바람, 갈바람, 마파람, 하늬바람, 동남풍, 동북풍, 서남풍, 서북풍이 있으며 그 외로 맞바람, 앞바람, ‘지물찌ᄇᆞ름’ 등이 있다. ‘지물찌ᄇᆞ름’ 은 제주해녀 사회에서 전승되는 바람으로 조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특히 ‘하늬바람’은 지역에 따라 북풍 또는 서풍으로 인식해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해녀들은 이러한 바람을 따져서 바닷물에 들고 나고 하였다.
<바람 이름>
|
표준어 |
방언 |
비고 |
|
샛바람 |
샛ᄇᆞ름, 지름샛ᄇᆞ름 |
동풍 |
|
갈바람 |
갈ᄇᆞ름, 서갈ᄇᆞ름, 섯갈, 섯갈ᄇᆞ름 |
서풍 |
|
마파람 |
마ᄇᆞ름, 마ᄑᆞ름 |
남풍 |
|
하늬바람 |
하늬ᄇᆞ름 |
북풍 |
|
동남풍 |
동마ᄇᆞ름, 동마ᄑᆞ름, 든샛ᄇᆞ름 |
- |
|
동북풍 높새바람 |
높샛ᄇᆞ름, 높하늬ᄇᆞ름, 동하늬 |
- |
|
서남풍 |
늦ᄇᆞ름, 든마ᄇᆞ름, 섯마ᄇᆞ름, 섯마ᄑᆞ름 |
- |
|
서북풍 늦하늬바람 |
갈하늬, 늦하늬ᄇᆞ름, 산내기, 서하늬ᄇᆞ름 |
- |
|
맞바람 |
맞ᄇᆞ름, 양두세, 양ᄇᆞ름, 양숨 |
- |
|
앞바람 |
거슨ᄇᆞ름 |
- |
|
- |
지물찌ᄇᆞ름 |
조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 |
파도와 물결도 물질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바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파도는 곰뉘(‘문둥누, 문둥절, 민둥누, 민둥절’)를 비롯하여 너울(‘놀, 누’), 이안류(‘후네기’), 해안파(‘ᄀᆞᆺ절’)와 ‘갈치절’(갈치의 하얀빛과 같이 너울거리며 이는 물결), ‘맞절’(조류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생기는 거센 파도), ‘삼성제절’(세 번 파도치면서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 등이 있다. ‘갈치절, 맞절, 삼성제절’은 제주해녀 사회에서 전승되는 파도 이름이다. 여기서 ‘절’은 ‘파도’를 뜻한다.
파도_삼양동_2021_김순자
달의 영향으로 인한 바닷물의 들고 남도 물질에 영향을 준다. 바닷물이 들고 남을 ‘물때’라고 하는데 한 달을 둘로 나누어 한무날부터 아츠조금, 한조금, 무쉬까지 15일 동안의 물때를 헤아린다. 요즘은 전통적인 물때를 버리고 열두무날인 ‘열두물’에 이어 ‘열서물, 열너물, 열다섯물’이라 한다. 이 물때도 제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동부지역에서는 “보름 일곱 그믐 일곱”을 기준으로 물때를 세고, 서부지역에서는 “보름 여섯 그믐 여섯”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하루 차이가 난다.
또 물질은 물질하는 장소에 따라 ‘ᄀᆞᆺ물질’, ‘덕물질’, ‘알물질’, ‘섬물질’ ‘닷물질’ 등으로 부른다. ‘ᄀᆞᆺ물질’은 갯가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이며 ‘덕물질’은 갯가 벼랑이 있는 곳에서 하는 물질로 대체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등지에서 치른다. ‘알물질’은 먼바다인 ‘걸바당’으로 나가서 하는 물질을 말하며 ‘섬물질’은 배 타고 물질 장소인 섬까지 가서 하는 물질로 배를 이용하는 ‘뱃물질’에 속한다. ‘닷물질’은 주로 곶(‘코지’)에서 치르는데 ‘테왁’과 망사리가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왁’에 닻을 매달아 하는 물질을 말한다.
물때에 따라 ‘조금물질’과 ‘사리물질’로 나눌 수도 있다. ‘조금물질’은 조금 때 물의 흐름이 완만할 때를 이용해서 하는 물질이며 ‘사리물질’은 물의 흐름이 드셀 때 하는 물질이다. ‘조금물질’은 물 흐름이 잔잔하기 때문에 먼바다까지 나가서 물질할 수 있는 반면 ‘사리물질’은 물살이 드세기 때문에 먼바다까지 나가서 물질하기는 어렵다.
바다풀은 자라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 일정량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전복이나 소라는 그 반대로 상황에 따라 허탕칠 수도 있다. 전복, 소라 채취 같이 허탕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헛물질’이라 한다. 미역이나 우뭇 가사리를 채취할 때는 큰 망사리를 이용하고, ‘헛물질’할 때는 그보다는 작은 망사리를 이용한다.
물질은 그 방법에 따라 걸어 다니며 하는 물질과 숨을 죽이고 물속에 들어가 하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걸어 다니며 하는 물질로 ‘배메기’와 ‘눈끌레기’가 있다. ‘배메기’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베어낸 바다풀을 그 밧줄에 걸치며 하는 물질이고 ‘눈끌레기’는 물안경인 ‘눈’을 쓰고 밑바닥을 보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이다. 또 숨을 죽인 물질로는 ‘비내기’와 ‘숨비기’가 있다. ‘비내기’는 주로 바다풀을 캘 때 하는 물질이다. 바다풀을 베기만 하면 바람과 물결에 따라 뭍으로 올라온 채취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망사리가 필요 없다. 반면 ‘숨비기’는 숨을 죽이고 바닷속에 들어가 채취물을 따고 망사리에 넣는 물질이다.
물질하다 보면 돌고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해녀들은 돌고래를 피하는 방법으로 “물 알로, 물 알로”라고 한다. 돌고래보고 ‘물 아래로, 물 아래로’ 가라는 뜻이다. 돌고래가 물속으로 잠기는 동안 해녀들은 물 위로 올라와서 무리를 지어 위기를 넘긴다. 또 식인 상어가 나타나면 “모여라, 모여라” 외치고 한데 모여 위기를 탈출하기도 한다. ‘모여라, 모여라’는 마라도에서 조사된 내용이다.
물질 행위 관련 단어로는 ‘메다, 바릇잡다, 숨비다, 심다, 쏘다, 줏다, ᄌᆞ물다, 트다, 홈프다’ 등이 있다. 해녀들이 물질하러 바닷가로 나가 첫 번째로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첫숨’이라 하고 바닷속이 어둡거나 물질할 장소인 여를 찾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헛숨’이라 한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그 가족들이 뭍으로 옮겨 나르는 일을 ‘마중’ 또는 ‘수종隨從’이라 한다. ‘마중’은 달리 ‘마줌, 풍중’이라 하고, ‘수종’은 ‘수중’이라 한다.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보호해야 할 수산자원이니 일정 기간 금채기를 정하여 채취를 금했다가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채취를 허락하는데 이를 해경解警 또는 허채許採라고 한다.
참고 문헌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고광민, 《제주 생활사》, 한그루, 2016.
필자
고광민(高光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