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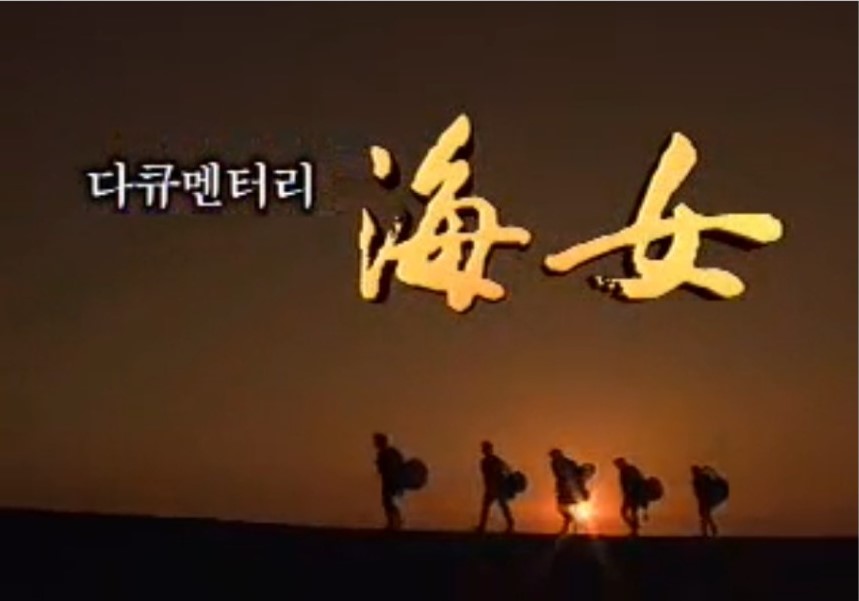
〈다큐멘터리 해녀〉_2006_제주MBC 제공
정의
제주MBC의 제주해녀의 가치를 역사, 공동체 문화와 정신, 해녀 생애사, 민속(민요, 당, 굿) 등을 통해 조명한 5부작 다큐멘터리.
내용
<다큐멘터리 해녀> 5부작은 2006년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MBC가 제작해 방영한 해녀 다큐멘터리(1편당 60분 분량)이다. 제주해녀의 역사와 ‘불턱’으로 대변되는 공동체 문화와 제주만의 독특한 민속문화, 험난한 삶의 바다를 헤쳐 온 제주해녀 생애사,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해녀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5부작을 통해 조명했다.
제1부 ‘제주해녀를 말하다’는 해양 문명사에서의 제주 해녀의 가치를 인문·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조명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만 존재하는 나잠어업인으로서 해녀의 기원-숙종 28년(1702)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작된 《탐라순력도》에 해녀를 그린 그림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6세기경부터 해녀가 존재했으며 17세기 전까지는 미역은 해녀가, 전복은 남자 포작인이 담당했다-을 시작으로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 동원된 1930년대 국내 최대 항일운동인 해녀항일운동까지 해녀의 역사를 짚어 봤다.
공동체 문화도 깊게 들여다봤다. 자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공동체 문화(합리적인 공동체 규약, 공동체 조업 형태)는 해녀문화가 어떻게 오랜 시간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 조명했다. 더불어 학교가 없던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성산읍 온평리), 4·3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일으켰던(조천읍 북촌리) 해녀의 경제적 기여도(수산물 일본 수출, 일본 출가물질 소득) 등을 살펴보며 해녀가 해양 문명사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제주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탐구했다.
제2부 ‘이어사나, 이어도사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당과 잠수굿, 민요 등을 기록했다. 거세고 사나운 바람의 땅에서 태어나 가쁜 숨 몰아쉬며 저승길을 오가야 하는 해녀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뿐이었다. 한 해의 무사안녕은 물론 풍요로움까지 관장하는 용왕신에 기대어 가녀린 목숨을 이어가야 했던 해녀들에게 있어 잠수굿과 당, 민요 등은 위안 의식이자 해녀문화의 정수가 아닐 수 없다. ‘이어사나, 이어도사나’에서는 잠수굿(동김녕리 잠수굿)을 비롯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어야 하는 해녀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인 당, 삼백예순날 바람 잘 날 없는 제주에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모진 바다를 넘나들어야 했던 물질의 고됨을 달래주는 해녀노래(민요) 등을 들여다봤다.
제3부 ‘어머니의 바다’는 바다에 탯줄을 묻고 바다에서 자라 바다로 돌아가는 제주해녀의 삶과 애환을 그려냈다. 한평생 물질로 일곱 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바다밭을 오갔던 한림읍 귀덕2리 양자임 해녀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과 애환을 투영했다. 열두 살 때 물질을 시작해 70여 년을 바다와 함께 한 양자임 해녀에게 바다는 친구이자 삶의 터전이며 일곱 남매를 키울 수 있었던 값진 재산이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버거운 고통도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미의 처절함도 모두 다 바다에 풀어냈다. 양자임 해녀의 생애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해녀의 험난했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4부 ‘출가出稼, 제주바다를 떠나다’는 1895년 경상남도로 첫 출가물질을 시작한 이래 경상북도 포항, 경주, 통영, 부산 영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삶의 바다를 넓혔던 제주해녀의 출가물질을 조명했다. 140여 년의 출가물질 역사를 안고 있는 ‘부산 속의 제주’라 불리는 영도구는 물론 1910년대부터 제주해녀가 정착했다는 포항시 구룡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아울러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출가물질 간 해녀들의 순탄치 않았던 삶도 조명했다. 제주해녀를 멸시하는 지역 사람들과의 마찰과 그들의 불법적인 착취에 분노하여 결성된 잠수권익옹호회의 해녀 권익보호운동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을 뿐 아니라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에 성공한 일본이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서 제주 어장을 침투함에 따라 시작된 외국으로의 출가물질 역사도 정리했다. 천재 해녀라 불리었던 일본 호타의 김영아 해녀, 강제징용으로 물질을 갔던 가나 야의 홍석랑 해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 속 출가물질 역사도 고찰했다.
제5부 ‘저무는 숨비소리’는 한때 제주바다도 모자라 전 세계 바다를 넘나들었던 제주해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찰했다. 1965년 2만 3천여 명이었던 해녀는 2004년 5천 6백여 명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해녀의 고령화 또한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1965년의 경우 30세 미만의 해녀가 1만 1천여 명이었으나, 2004년의 경우 1명에 불과한 현실을 보여주며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해녀의 현실과 위기를 과연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잡은 일본 해녀의 사례(후쿠오카현 가네자키 해녀, 보소반도 시라하마 해녀)를 살펴보며 앞으로 제주해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징과 의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해녀의 공동체 규약(마라도 향약 발굴 등)과 불턱 문화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제주해녀의 경제적 기여도를 학교바당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제주해녀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조명했다. 경주시 감포와 포항시 구룡포, 일본 호타와 가나야 등 출가물질 갔던 제주해녀의 육성 증언은 물론, 일본 해녀 마을인 후쿠오카 가네자키 마을과 보소 반도 시라하마의 바다 어장 관리와 해녀 보존 방안들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제주해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송문화진흥회 ‘2006 구성작가상’ 은상과 2006년 방송위원회 ‘6월, 이달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참고 문헌
김영·양징자(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좌혜경, <제주해녀(잠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 <해녀학> 정립 가능성 모색: 문화비교론적 관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 비평사, 1989.
필자
안현미(安鉉美)
